
▲문기주 시인
[오코리아뉴스=강지혜기자] 일간경기 회장이고, 한국기자연합회 총재이면서,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의 한류문화강국 추진위원장인 문기주가 월간 ‘한맥문학’ 2월호 통권 365호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를 쓰기 시작했다. 입 안에서 맴도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종이 위에 수놓았고, 그것들을 다시 입에 넣고, 곰삭을 때까지 음미했다. 어느 날부터 허기지던 배가, 임신한 여자처럼 불러오기 시작했다.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시조에 굶주리고, 시에 굶주린 이들에게, 단 한 숟가락이라도 글을 먹이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다. 먼 옛날 시흥에 취한 선비들이, 찻잔 속에 하늘의 달과 별을 친구로 불러들였던 것처럼. 나도 자연을 벗삼은 이들과 함께 만년 문학청년의 길을 걷고 싶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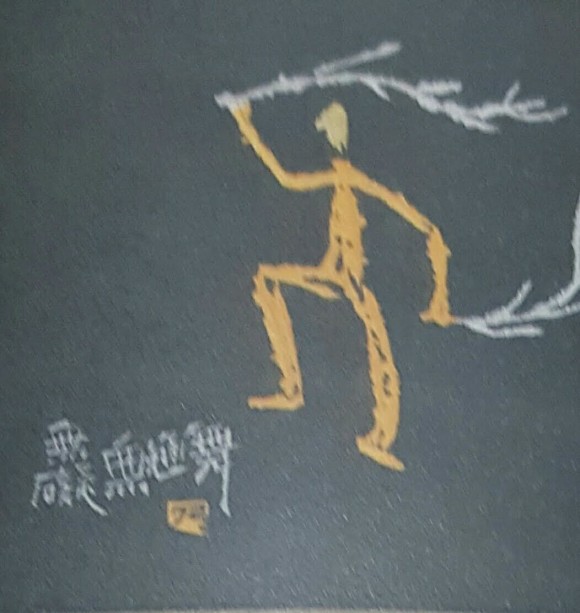
-다음은 5편의 등단 작품이다.
화순아 사랑해서 미안하다
흙에서 태어나
본향이 그리울 때
콧잔등 시큰시큰
눈물짓게 하는 곳
땅거미 연기처럼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만 놀고 밥 먹어라!
정겨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곳
찔레순 먹고 깨댕이 벗고
날이 저물도록 물장구 쳤던
감푸게 놀다가 도채비들을 만나면
왼 씨름 오른씨름도 서슴지 않았던
내 고향 화순군 도곡면 덕산마을
그 냇가 그 언덕 그 바람 그 구름을
음흉한 두꺼비처럼 뒷걸음질로 찾아가
날마다 어둠 속에서 훔쳐보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 화순군 도곡면 덕산마을
어머니
창호지 너머 바람소리가 매서울 때
이불속에서 어머니 젖꼭지를 만지면 평온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앙증맞은 제비꽃이 피어나고
종달새가 제 목청을 한껏 가다듬어
보리밭 이랑마다에서 노래를 불러주어도
방울방울 호미 끝에 맺힌 어머니의 땀방울은
눈물이고 슬픔이고 한숨이라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등진 나는 어렸고
타지에서 한동안 배가 고팠지만
지금은 고향산천을 먹여 살릴 만도 한데
선영을 지키며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운주사의 목탁소리만 내 안에서 울고 있다.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빌고 있는 어머니
공작에게 배운다
소나기 한차례 지나가더니
건너 편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
나 어릴 적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늘도 변함없이 쿵쾅거린다.
얼마 전 동물원에서
무지개를 본적이 있다.
공작꼬리에서 펼쳐진 것은
우리 안에 갇힌 무지개였다.
그때 내안에서도
무언가 뜨기 시작했다.
희·로·애·락·애·오·욕
눈부시게 슬픈 무지개였다.

▲두 개의 무지개를 생각하며
운주사에서
고요한 운주사
눈길을 거닐다가
천개의 불상 앞에서
흰 옷깃 여미고
기도하는 이를 보았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천개의 탑을 세워서
극락을 이루려는 그 기원 속에
내 몫도 슬그머니 보탰다.
천년 세월이 가고
꿈이 늙어질 즈음에
천만 개 웅얼거림을 실은 배가
천불 천 탑 운주사에서
물길을 따라 두둥실 떠나간다.
사람아!
흰옷 입은 사람아!
그대가 보낸 간절함이
머지않아 부처님 전에
다다를 것을 믿는다.
나는
아직도
불상 뒤에 숨어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불상뒤에서 숨어서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
백야산 이야기
세월의 풍파로
제 속살을 깎아질러
우뚝 선 저 바위산을 보라.
멀리서 바라보니 흰 거위 떼
옹기종기 품고 있어 가히 절경이다.
마당바위 아래서부터 흐드러지게
피어나 산천을 뒤덮고 있는 것은
달짝지근한 꽃향기가 아니라
불이다. 혼불이다.
아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일천구백오십 년 유월 이십오일
내나라 내 민족이 들이댄 무자비한 총구 앞에서
꽃잎처럼 떨어져 한 칠십여 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산철쭉으로 피어난 꿈에서도 보고 싶은
우리 누님이고, 우리 부모형제이다.

▲화순 백야산